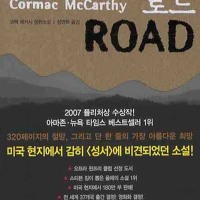얼마전 한 신문의 칼럼에 촛불이 등장했다. 칼럼의 쓴 학자는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를 높이 사면서도 일본이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북방영토로 게재한 사건과 북한에서 남측 민간인이 초병의 총을 맞고 숨진 일에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의아해했다. 촛불이 타오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의미다. 어떤 이들은 촛불집회가 반미집회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한다. 미국에서 날개짓을 시작한 쇠고기 문제가 결국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없는 우려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촛불은 든 이유를 '반미'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한다면 문제가 크다. 촛불은 미국 앞에서 무능한 우리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목소리였다.
쇠고기 파동에서도 보듯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다. 쇠고기 문제를 포함해 전작권 환수,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 분담, FTA등 미국과 얽힌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그리고 사안 하나하나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경제를 넘어 사회적인 것들이다. 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한-미FTA만큼의 파장을 가져올 한-EU FTA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영 딴판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나름 설득력도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경찰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의 파워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딜 가든 미국은 환영과 비난 공동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왜 논쟁적 존재가 된 것일까? 핵심이 되는 것은 역사다. 미국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반대의 입장에 선 이들은 '역사'를 모른다고 말한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참전을 이끌며 수세에 몰린 전세를 뒤집고 국가가 재건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은 자유주의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며 근대화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간단한 논리다.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 기록된 것만을 역사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사기와 다름 없다. 감춰진 것, 기록되지 못한 것 또한 역사다. 대한민국을 빨갱이의 손아귀에서 구해주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군들이 기록에 남은 역사라면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 역사 하나가 1990년대 후반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근리가 그 주인공이다. 1998년 AP통신에 의해 첫 모습을 드러내고 노근리는 한국전쟁의 다른 역사를 비추기 시작했다.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 동안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았던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눈을 적시고, 마음을 울렸다. 모르고 있어서 미안하고 알려하지 않은 죄송함이었다. 이 후 한국과 미국의 합동조사가 시작되고 정부에 위원회가 생기면서 쌍굴에서 이유없이 죽어간 이들의 한풀이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어쩐지 그 온도가 식어가는 느낌이다.
노근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결과물이 쏟아졌다. AP기자들의 책 <노근리 다리>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전, 소설, 기록집 등 손만 뻗으면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홍대 상상마당에 극장에서 영화를 기다리던 중에 그 중 하나와 마주쳤다. 2006년도에 춢판됐으니 이미 2년이 다 된 박건웅의 만화 <노근리 이야기>. 책의 두께에 멈칫했지만 책장을 넘기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 600페이지를 넘겼다.
300페이지가 넘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의 <학살> 장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쌍굴안에 갖힌 사람들의 사연사연 하나가 입에 담기 벅차다. 책을 덥고 집에 돌아와 노근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화책 속의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다시 떠올리기도 두려운, 인간으로서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망자들과 생존자들을 앞에 두고 그 때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미안하기까지 하다.
이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는 방법은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것 같다. 망자와 생존자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들이 잊혀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노근리 사건은 노근리 만의 사건이 아니다. 미군에 의해 양민이 학살당한 사건을 노근리가 환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의 시기에 미군, 국군, 북한군에 의해 이유없이 목숨을 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 문제가 미국과 얽히면서 반미 혹은 친미로 나뉘어 정쟁을 할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난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의해서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요즘에는 과연 무엇때문에 친미를 하고 무었때문에 반미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도 정치적으로 변해 기본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노근리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노근리 사람들이 목적지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슬픈 역사가 재연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노근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많은 결과물이 쏟아졌다. AP기자들의 책 <노근리 다리>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사진전, 소설, 기록집 등 손만 뻗으면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홍대 상상마당에 극장에서 영화를 기다리던 중에 그 중 하나와 마주쳤다. 2006년도에 춢판됐으니 이미 2년이 다 된 박건웅의 만화 <노근리 이야기>. 책의 두께에 멈칫했지만 책장을 넘기자마자 앉은 자리에서 마지막 600페이지를 넘겼다.
300페이지가 넘은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의 <학살> 장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쌍굴안에 갖힌 사람들의 사연사연 하나가 입에 담기 벅차다. 책을 덥고 집에 돌아와 노근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화책 속의 장면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다시 떠올리기도 두려운, 인간으로서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망자들과 생존자들을 앞에 두고 그 때의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미안하기까지 하다.
이 미안한 마음을 덜어내는 방법은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 유일한 것 같다. 망자와 생존자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들이 잊혀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실 노근리 사건은 노근리 만의 사건이 아니다. 미군에 의해 양민이 학살당한 사건을 노근리가 환유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쟁이라는 극단의 시기에 미군, 국군, 북한군에 의해 이유없이 목숨을 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이 문제가 미국과 얽히면서 반미 혹은 친미로 나뉘어 정쟁을 할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난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의해서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요즘에는 과연 무엇때문에 친미를 하고 무었때문에 반미를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너무도 정치적으로 변해 기본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노근리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다. 노근리 사람들이 목적지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다시는 슬픈 역사가 재연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노근리가 있다. 재작년 촬영을 마친 이상우 감독의 영화 <작은 연못>이다. 촬영을 마치고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개봉 소식이 없다. 김민기의 노래와 같은 제목의 영화, 실제로 작곡가 김민기가 자신의 모든 노래를 영화에 써도 좋다는 허락을 했다고 한다. 그의 노래가 벌써 귀에 앉으면서 영화 포스터에서 눈물이 베어나온다. 티저 포스터 한 장에 이토록 울림을 받았던 적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노근리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작은 연못>이 개봉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