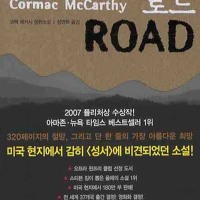가네시로 가즈키는 몇 안 되는 좋아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소설은 언제나 힘이 넘친다. 거기에는 젊음에 대한 무한한 긍정이 존재한다. 젊음은 그의 소설 속에서 항상 부조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어떤 고난도 젊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가 매력적이었던 것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회문제를 10대들이 흔히 겪을 젊음의 고민으로 그려냈기 때문이었다. 그 가벼운 경쾌함 속에는 사회를 고발하려는 무거운 주제의식이 날카롭게 자리해 있었다. <플라이, 대디, 플라이>를 비롯한 ‘더 좀비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신작 <영화처럼>은 <연애 소설>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단편 모음집이다. 원제는 ‘영화편(映畵篇)’으로 각각 다섯 편의 영화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이뤄져있다. (참고로 <연애 소설>의 원제는 각각의 작품들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뤄져 있다는 의미의 ‘대화편(對話篇)’이었다.) 이번에도 그의 경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는 여전하다. 또한 그동안 보여줬던 주제의식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화처럼>은 정말로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애정이 매 페이지마다 느껴지는 그런 단편집이다.
처음 실린 ‘태양은 가득히’는 소설의 영화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느 소설가의 이야기로, 주인공이 재일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가네시로 가즈키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사적인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고>가 그랬듯이 ‘태양은 가득히’도 그 속에 담긴 사적 고백의 이야기들이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영화에 대한 두 주인공의 추억들은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반문하게 만들 정도다. 또한 이언 맥큐언의 <속죄>(영화 <어톤먼트>의 원작)를 떠올리게 하는 결말은 가네시로 가즈키 자신의 소설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져,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첫 작품의 감동 때문인지 이어서 수록된 <정무문> <프랭키와 자니> <페일 라이더>는 조금 평범하다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각각의 작품들이 모티프로 삼은 영화를 보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다.
가네시로 가즈키 소설을 읽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적인 각각의 작품들 속에 그것들을 이어주는 헐거운 연결고리 같은 요소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레벌루션 No. 3> <플라이, 대디, 플라이> <스피드>에 등장하는 ‘더 좀비스’가 그렇고, <연애 소설>에 등장하는 다니무라 교수가 그렇다. <영화처럼>에서는 영화 <로마의 휴일>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인 <사랑의 샘>에서 <로마의 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난다. 어쩌면 각기 다른 영화들을 모티프로 한 다섯 작품은 결국 <로마의 휴일>을 위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연애 소설>에서 ‘꽃’에 나왔던 도리고에 가(家)의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가끔 씨네21이나 필름2.0을 통해 오승욱 감독이나 서울아트시네마의 김성욱 평론가의 글을 읽다보면 어린 시절을 영화와 함께 보냈던 이들의 영화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가 있다. <영화처럼>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단편집이다.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최근에서야 깨달은 나로서는, <영화처럼>이 풀어놓는 영화에 대한 추억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다섯 편의 단편들을 읽다보면 어느 샌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처럼>은 진심으로 ‘영화’를 위한 단편집이다.

덧. 책을 다 읽은 뒤 참지 못하고 결국 <로마의 휴일>을 봤다. 그냥 봤어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을 텐데, 책 때문인지 그 감동이 더욱 배가된 느낌이었다. 특히 엔딩 신에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가가 살며시 젖어드는 장면은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시간나면 책에 나온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고 싶다.
그의 신작 <영화처럼>은 <연애 소설>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단편 모음집이다. 원제는 ‘영화편(映畵篇)’으로 각각 다섯 편의 영화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이뤄져있다. (참고로 <연애 소설>의 원제는 각각의 작품들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뤄져 있다는 의미의 ‘대화편(對話篇)’이었다.) 이번에도 그의 경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솜씨는 여전하다. 또한 그동안 보여줬던 주제의식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화처럼>은 정말로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애정이 매 페이지마다 느껴지는 그런 단편집이다.
처음 실린 ‘태양은 가득히’는 소설의 영화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어느 소설가의 이야기로, 주인공이 재일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가네시로 가즈키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사적인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고>가 그랬듯이 ‘태양은 가득히’도 그 속에 담긴 사적 고백의 이야기들이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다. 영화에 대한 두 주인공의 추억들은 스스로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를 반문하게 만들 정도다. 또한 이언 맥큐언의 <속죄>(영화 <어톤먼트>의 원작)를 떠올리게 하는 결말은 가네시로 가즈키 자신의 소설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것이 느껴져,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재능이란 곧 힘이야.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할 지, 아니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아까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자랑하는 쪽을 선택한 거지.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으면서 자신의 힘은 보여주고 싶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치 자위를 하듯 혼자 즐기기 위한 독선적인 작품이 되고 만 거지.”
- ‘태양은 가득히’, p.67
반면, 첫 작품의 감동 때문인지 이어서 수록된 <정무문> <프랭키와 자니> <페일 라이더>는 조금 평범하다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각각의 작품들이 모티프로 삼은 영화를 보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다.
가네시로 가즈키 소설을 읽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독립적인 각각의 작품들 속에 그것들을 이어주는 헐거운 연결고리 같은 요소들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다. <레벌루션 No. 3> <플라이, 대디, 플라이> <스피드>에 등장하는 ‘더 좀비스’가 그렇고, <연애 소설>에 등장하는 다니무라 교수가 그렇다. <영화처럼>에서는 영화 <로마의 휴일>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인 <사랑의 샘>에서 <로마의 휴일>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난다. 어쩌면 각기 다른 영화들을 모티프로 한 다섯 작품은 결국 <로마의 휴일>을 위한 작품일지도 모른다. <연애 소설>에서 ‘꽃’에 나왔던 도리고에 가(家)의 이야기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가끔 씨네21이나 필름2.0을 통해 오승욱 감독이나 서울아트시네마의 김성욱 평론가의 글을 읽다보면 어린 시절을 영화와 함께 보냈던 이들의 영화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느낄 수가 있다. <영화처럼>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단편집이다.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최근에서야 깨달은 나로서는, <영화처럼>이 풀어놓는 영화에 대한 추억들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다. 다섯 편의 단편들을 읽다보면 어느 샌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처럼>은 진심으로 ‘영화’를 위한 단편집이다.

덧. 책을 다 읽은 뒤 참지 못하고 결국 <로마의 휴일>을 봤다. 그냥 봤어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을 텐데, 책 때문인지 그 감동이 더욱 배가된 느낌이었다. 특히 엔딩 신에서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가가 살며시 젖어드는 장면은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시간나면 책에 나온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