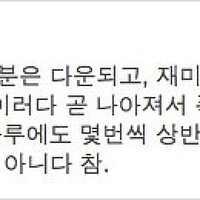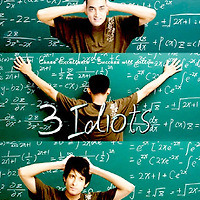초현실적 리얼리즘으로 유명한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놀랍게도 그 자신은 환상소설을 쓴 적이 없다고 말한다.
대단한 상상이나 공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믿는 것,
자기가 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렸을 뿐이라고 말이다.
미술을 전공하고 자파리 예술단에서 연극을 하며 독립영화를 찍는
다재다능한 제주도 출신의 감독이 만든 제주도 영화 <어이그 저 귓것>은
말하자면 마르케스의 작품과 동일한 연장선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제주도의 유수암에 있는 한 점빵을 배경으로
아픈 몸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무명의 가수,
노래가 하고 싶어서 농사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다니는 철없는 애아버지,
댄서가 되고 싶은 백수 청년,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매일 술에 취해 아무데나 누워 자는 하르방.
저 귓것들, 정말 별 볼일 없는 이들의 일상을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찡하게 그려낸 이 작품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소위 성공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볼품없는 인물들,
관광지라고 내세울 것이라곤 없는 친숙한 동네 어귀,
간간이 흘러나오는 포크송과 민요도 지나치게 귀에 익어 서글프다.
하지만 환상의 섬 제주도를 관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주도를 고향으로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이 광경에 내 이야기를 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은 대단한 영화를 만들고 싶거나
또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만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오멸 감독의 영화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영화 같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같은 영화라서 몹시 재미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영화의 미덕은 여기에 있다.
친구들과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자신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설명처럼,
이 일차원적인 이야기는 저 멀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밀려 어느새 동네 점빵은 사라지고
이제 현대식 대형마트로 가서 장을 봐야 하듯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란 같이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임은 분명하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해서 예술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질구질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리다.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대단한 특수 효과도, 놀라운 액션도 없는
이 영화가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가 인상적인 것은,
또 그렇게 우리를 웃기고 울리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