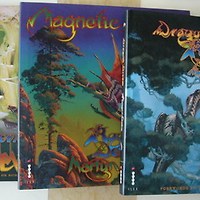RICHARD ESTES, THE CANDY STORE, NEW YORK CITY(1969)
나는 단지 호퍼와 슬론, 티보의 그림을 실제로 보고 싶었을 따름이다.
거창한 광고와는 달리 아마 한두 작품 정도 걸려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미국 미술은 그리 나쁠 것도 그렇다고 딱히 좋을 것도 없었다.
1960년대 작품들에는, 대표적인 워홀과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보여주듯이
현란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등장에 매혹되면서
그래도 사회에 대해 고뇌하는 예술가가 겹쳐져 있다.
작품 자체는 시대상이 그렇듯이 그리 대단한 건 없지만
TV와 광고의 노골적인 상업성, 성적이고 저급한 대중만화, 평준화된 대량생산품을
예술작품과 갤러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행위는 도발적이고 신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작품들에는
휘황찬란한 소비문화에 완전히 압사해버린 한 사회와
특권을 누리는 엘리트가 아니라 유망한 사업가와 스타가 된 예술가가 그려져 있다.
아들 부시의 대통령 당선, 타락한 월스트리트의 몰락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회가 그토록 무지하고 무식할 수 있는지
철학과 반성, 지성의 공동화空洞化에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미국 미술은 그 이유를 매우 잘 설명해준다.
긴 역사 속에서 실패와 잘못을 거듭하면서 인류가 이룩해온 문화를 공부하며
'현재'에 대해 고뇌하기를 포기한 예술가에게 남은 것이라곤
사소한 오브제에 대한 집착밖에 없다.
최근에 나온 미국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번역할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스러웠는데,
말하자면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멜빌, 트웨인, 헤밍웨이 같은 지난 시대의 작가에 대한 향수를
오늘날의 직업 작가들은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일탈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더는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면
마르케스의 말처럼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 번 읽을 수 있는 책 대신에
재빨리 새 책을 내서 보다 많이 팔려고 작정한 서점과 출판사의 탓이다.
그럼에도 미국 미술의 저력은 전시실이 아니라 아트숍에서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다.
(없어도 되는) 생활용품을 어찌나 사고 싶게 만드는지 충동구매를 피할 수 없었고,
가난해서 하나밖에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로 슬펐다. 흑흑.